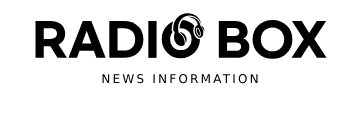“Gen Z Stare”와 대학 강의실의 침묵 — 그 배경을 들여다보며
요즘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때때로 정적이 흐릅니다.
“누가 자기소개 먼저 해볼까요?”라는 말에 학생 전원이 동시에 침묵을 지키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영혼이 잠시 몸을 떠난 듯한 느낌이 들죠.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대학 강의를 했던 예술가 Doug Weaver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를 “Gen Z Stare”(Z세대 응시)라 부르며, 최근 Business Insider를 통해 그 심각성을 고백했어요.
이 글에서는 Doug의 이야기와 저의 개인적인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Z세대가 겪고 있는 변화, 소통 방식의 차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와 연결고리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Z세대 응시, 그저 ‘무표정’이 아닙니다
Doug Weaver는 “Z세대 응시”를 처음 겪었을 때, 꽤 당황했다고 해요.
분명히 질문을 던졌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조용히 바라는 눈빛만으로 교사를 바라보는 학생들.
어떤 경우엔 직접 수업을 하고 있는데도 학생이 오히려 Doug의 ‘강의 영상’을 틀어놓고 시청하고 있기도 했죠.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 상황입니다.
저 역시 강의 중 학생들에게 생각을 물어봤을 때, 똑같은 응답이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정적’. 처음에는 제가 설명을 못했나 싶었고, 질문이 너무 추상적인가 하는 고민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건 단순한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와 시대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무너진 ‘사회의 기본 단위’, 소통 능력
Z세대가 ‘무표정’하거나 ‘소극적’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놀랍게도 이는 전적으로 그들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미국심리학회(APA)의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에 사회성 발달이 중요한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있던 이들은 얼굴을 보며 대화하고, 친밀감을 쌓고,
오프라인 사회적 갈등을 조율하는 기술을 익히지 못했습니다.
Doug 역시 영상 강의에 의존했던 시기 이후 학생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대면 수업에서 질문을 던져도 손을 들지 않거나, 말을 아끼는 경우가 많다고요.
심지어 교실 내에서 직접 실습을 하는데도, 학생들은 오히려 그 상황을 촬영한 ‘녹화 영상’을 보며 더 편안함을 느끼는 아이러니한 현상도 생겼습니다.
물론 Z세대의 이런 행동은 효율성이나 정보 접근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육의 본질이 소통과 피드백, 현실 맥락 속에서 살아있는 학습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무언가 근본적인 허점이 있다는 느낌, 지우기 어렵습니다.
현실보다 더 ‘편한’ 화면 속 세계
여러분은 현실보다 온라인 또는 영상이 더 편하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 줌 수업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는데, 특정 학생이 질문을 할 때는 채팅창에만 글을 남기고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내성적인 성격이라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말을 내뱉는 순간 내 얼굴이 클로즈업되고 시선이 집중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문자로 소통하면 감정이 덜 노출돼 더 편하다고 했어요.
이 세대에게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자 소통의 버퍼가 되어버린 겁니다.
Z세대는 정말 ‘무관심’한 걸까요?
Doug는 “이 학생들이 단순히 수업이나 인간관계에 관심이 없다기보단, 자신을 표현할 방법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특히 감정이나 생각을 내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졌다고 하네요.
미국 정신의학회(APA)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18~25세 청년층의 불안 및 우울 경험 비율은 60%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어느 세대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이들이 ‘응시’하고 ‘침묵’하는 이유는 결코 게으름이나 무관심이 아닌, 내면적으로 위축되고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우리 교육 시스템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
Doug는 강의 내내 학생의 이름, 배경, 관심 분야 등을 물어보며 수업을 개인화하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끝끝내 아무런 반응도 없이 한 학기를 마무리한 학생도 있었다고요. 교수 입장에서는 꽤 허탈하죠.
하지만 그는 이런 상황을 학생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육 시스템 자체가 ‘이미 실패 중’이라는 자성과 함께, 정신건강까지 포괄하는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학생이 고요히 앉아 있지만 울고 있을지, 질문이 있어도 입 밖으로 낼 용기가 없을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된 경험’과 ‘안전한 소통 공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함께하는 경험’을 다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다시 살아 있는 사람과 눈 맞추고, 감정을 나누며, 서툴지만 그 경험 속에서 자신만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교수 한 명의 역량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교육 기관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만이 이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학생이 먼저 다가오길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Z세대의 변화된 소통 방식,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혹시 직접 경험해보셨거나, 자녀나 조카를 통해 이 세대의 묘한 ‘응시’를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대가 만드는 미소도 없는, 침묵 어린 ‘소통’을 다시 해석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말 못할 혼란과 아픔이 있고, 우리 사회가 거기에 주목할 때입니다.